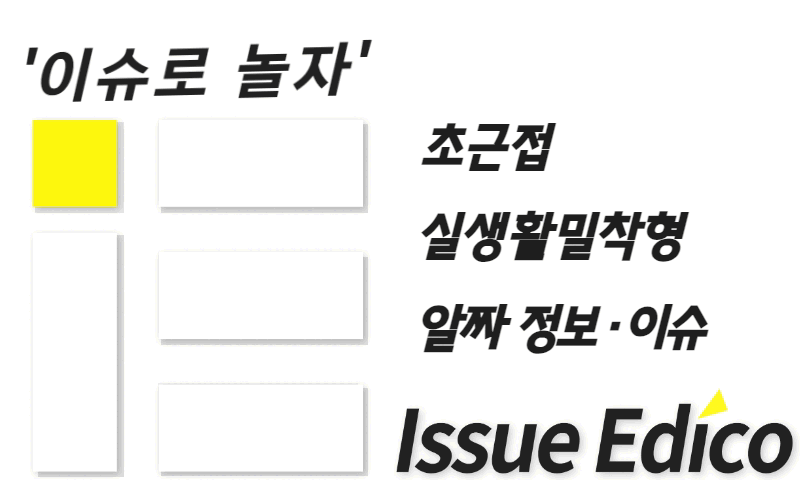차분한 봄비가 내리던 어젯밤, 한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배우 정진영이 처음 감독을 맡은 2020년 6월18일 개봉작 '사라진 시간'을 봤습니다. 관객들이 보기에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영화라 영화 소개도 살펴봤습니다.
한적한 소도시의 시골마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을 지닌 채 지방 근무를 자청한 교사 부부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치고,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형구는… (중략) 집도, 가족도, 직업도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과연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반전을 매끈하게 넘겨버린(?) 결말도 그렇고 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관객층이 있었는지 일부에서는 평가가 좋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정진영 감독이 독립영화로 제작을 고려했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관객들의 반응을 짐작했었던 듯합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면 대부분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15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영화도 역시나 2020년 당시 18만6000여 명의 관객동원에 그치며 손익분기점 기준 27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요.
정 감독은 영화 개봉 일주일 전, 국내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문의 화재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믿었던 세상이 사라져 삶이 단번에 뒤바뀌는 설정'은 관객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려는 목적에 기반을 뒀다고 제언했습니다.
하나의 삶을 바라보는 타인과 자신의 관점, 여기서 비롯되는 부조리로 갈라지게 된 후 마주하는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관객에게 보여줘 서로를 살피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만약 이 영화 줄거리처럼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에 자립준비청년으로 통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시기가 끝나 자립에 나서는 청년들이죠. 이들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동시에 생존에 대한 난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갓 어른의 나이가 돼 아이의 모습이 만면에 남아있는 이 어른아이들은 적은 지원금과 짧은 지원기간은 둘째 치고 부동산 등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공임대를 놓치거나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밀리게 됩니다.
또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이는 동시에 심리·경제적 공백도 찾아와 주변에서 차츰 잊히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자립이라는 모호하면서도 거창한 기대감이 교육·의료·취업 공백 등의 문제를 덮는 겁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연명비용, 단기간의 지원정책은 허울 좋은 정부의 구실로 자립은 곧 방임이 되는 셈이고요.

정부는 이달 11일 자립준비 청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위탁·시설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의 경우 희망 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원 내용은 ▲자립수당 월 50만 원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 선정 등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지원 대책은 기존과 거의 다를 바 없어서 아쉽기만 하네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이미 제시한 내용이니까요.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만 22세 이하 전세임대주택 무상 거주 지원,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진로지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고용센터 내 전담자를 통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은 기존 대책입니다.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고립은 더욱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26일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이하 무서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이릅니다.
조사에 응한 19~29세 청년 419명 가운데 195명 정도가 무서운 생각을 했네요. 그나마 2020년 조사에서는 50%였으니 지원이 미미했던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로 모든 것을 추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지원의 중요성은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결과 더 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심각하게 무서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는데 그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등이네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또는 든다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가 30.3%로 최다였고 다음은 ▲운동·취미 등 지원(24.7%), ▲심리상담 지원(11.0%), ▲정신과 치료지원(9.6%) 등의 뒤따랐습니다.
홀로 서려면 우선 살아야 하죠. 그리고 자립은 고립된 생존이 아니라 연결된 삶이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