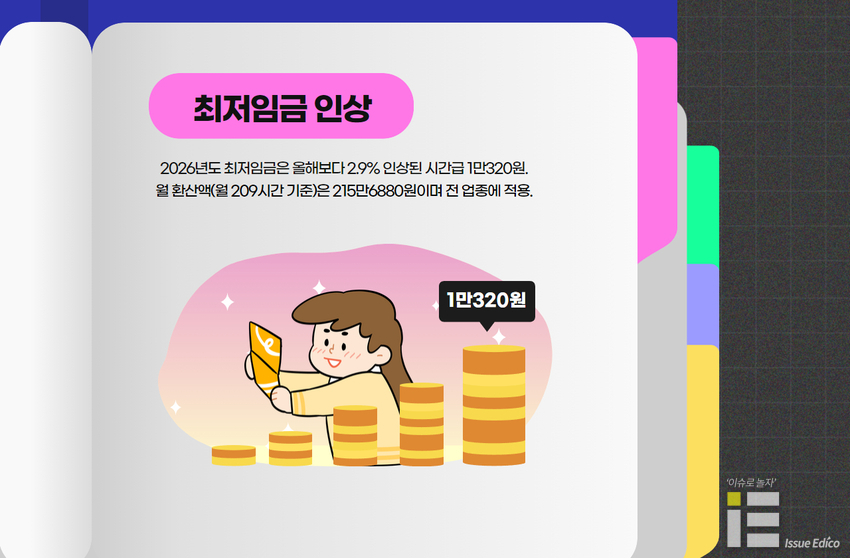
내년도 최저임금에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이후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투표 없이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네 명이 불참했기에 '반쪽짜리' 합의일뿐더러,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 중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한다면 노동부는 이를 숙고한 뒤,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이 되면 임금 상승 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작년 4월 기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인데요. 이를 이슈에디코에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부터 살펴볼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휴일에 1일 치 임금이 주어지는데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기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만약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되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올해 8만240원에서 내년 8만2560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고용보험법을 보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생활 보장을 위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일한 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이 되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액을 이용해 계산하고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때도 최저임금을 기준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여러 보상 기준을 만드는 데 최저임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보통 보상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최저임금이 쓰이지만, 직업훈련수당과 진폐보상연금은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된다네요.
이 밖에도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현장실습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항에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고요.
각종 정부 지원·보상에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일례로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보면 사망자의 일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요.
아울러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남북 피해자 보상금·정착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형사 보상 ▲범죄 신고자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금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